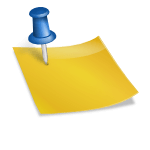![미아로 산다는 것-박노자 [2020-266/1731 : 사회비평] 1](https://blog.kakaocdn.net/dn/vwaE9/btrohUvo8cv/R2pKwWEeIKND05ntI2WxK0/img.png)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태생으로 본명은 블라디미르 티포노프, 2001년 귀화해 박노자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된 저자. 스승 미하일 박 교수의 성을 따르고 러시아의 아들이라는 뜻의 노자를 이름으로 지었다. 러시아에서 조선사를 전공하고 고대 가야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다소 독특한 경력을 자랑하는 저자는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동아시아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 책 미아로 산다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을 폭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제목이 뜻하는 바가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마지막으로 읽는 서문-미아의 단상을 먼저 읽어봤다.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단어는 미아가 아닐까 싶은데 자신이 한때 선천적으로 흡수했던 문화를 자신의 자식이나 제자들에게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란다. 아이들과는 언어적 기반이 달라 제자를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감동적으로 읽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쩐지 외로움이 묻어나올 뻔했지만 여기서 지그문드 바흐만의 액체 근대라는 말을 쓰는 후기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으로서 모든 것이 흐르는 물과 같이 너무 빨리 변하여 장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생에서 안정되고 보장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무산자에 상당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 같은 평생직장이란 말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장시간 노동으로 연애 같은 장기적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도 없는 데다 항상 주거지 걱정에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1장 평온의 대가는 권력과 중독, 덕후와 술, 탈남이라는 선택을 다룬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썩게 하는 3대 요인을 삼독이라고 하는데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삼독을 키우는 것이 바로 권력이며 어쩌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급과 계급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모두 권력의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제2장 <남아 있는 상처>에서는 이제 놀라운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상으로만 여겨지게 된 한국 사회의 여러 불편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학벌 중심의 사회, 사회적 열공강박증, 반여성적 환경에서도 출산율이 0이 아니라고 되돌아와 놀라야 하는 현실, 가족이라는 개념이 허무하게 들리고 섹스를 하고 싶을 정도의 에너지도 모두 고갈된 사회, 남성 우월주의 사고에 따른 여성에 대한 멸시와 분노 등은 글만 읽어도 불편하고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 답답함은 결국 3장 한국, 반 사회에까지 이어진다. 지방의 식민화, 극심한 성 불평등, 외국인 차별, 인격 모독에 대해 담담하게 서술했고, 제4장 과거의 유령들과 제5장 전쟁이자 어머니인 세계에서는 일제 청산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진 불합리한 역사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 등을 서술했다.
모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 빈약하고 진부한 느낌도 들며 한 편의 가벼운 에세이를 읽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글 전체가 산만하고 사회비평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을 문제 밖에서 거리감을 갖고 다루는 기분이다. 어쩌면 이것도 내 안에서 그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일까. 귀화했지만 역시 같은 민족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에 그의 글을 읽으며 완전히 동조할 수는 없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미아로 산다는 것-박노자 [2020-266/1731 : 사회비평] 2](https://blog.kakaocdn.net/dn/djPv9z/btrodRTI7Gd/G6sMRmkDBwo0CPMDiRzLo1/img.jpg)